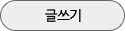이번엔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다.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어 WSJ까지 5일 '한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10월 위기설'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맞물린 지난해 10월 외신들의 행태와 판박이 현상이다. 한국 정부가 얻어 터지고 나서 다급하게 반박하는 것까지 반복되고 있다. 고약한 데쟈뷔다.
WSJ는 이날 “한국 정부가 위기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한국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원화 가치 하락을 막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의 '한국 때리기'는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26일자에서 “한국 경제의 위험도가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FT는 “한국의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한국의 외환 상환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10월 6일 FT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금융 위기의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표현했고, 같은 달 9월 WSJ은 "한국은 아시아의 아이슬란드인가"라고 보도했다.
정부 대응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기사가 나오면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게 전부다. 자꾸만 비판이 쏟아 지다 보니 재정부에서는 “일일이 코멘트하고 대응하는 것도 지쳤다”는 반응도 나왔다.
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외채통계의 경우 한국 같이 주기적으로 자세하게 공개하는 나라가 없다"며 "시장의 기대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먹혀 들지가 않으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 안팎에서 “외신의 생리를 너무 모른다”는 것에 대한 자성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것 이상으로 외신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하는데 외신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다는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4일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석이었던 외신담당 대변인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외신의 한국 때리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한참 늑장대응을 한 셈이다.
재정부는 '외신 코스트'가 커져가자 허경욱 제1차관이 지난 3일 이코노미스트, FT 등 주요 외신 매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직접 외신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럼에도 외신 기자들은 이날 윤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한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건전성 비율 33%’와 같은 지표에 대해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이 같은 외신들의 '과도한 불신'의 원인으로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한국의 경제구조와 외환위기 때의 '원죄'가 거론된다.
수출의존도가 다른 신흥국과 비교할때 월등히 높고, 자금시장 개방폭도 넓어 지금같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불안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지난 97년 외환위기가 불거지기에 앞서 외환보유액을 거짓으로 공표했던 ‘양치기 소년’ 이미지도 아직까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 대기업 외신 담당 홍보맨은 “외신들이 어떤 기사를 쓸 때는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갖고 쓴다”며 “오보를 했다고 하면서 일회성의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명확한 논리를 갖고 설득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월 위기설'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맞물린 지난해 10월 외신들의 행태와 판박이 현상이다. 한국 정부가 얻어 터지고 나서 다급하게 반박하는 것까지 반복되고 있다. 고약한 데쟈뷔다.
WSJ는 이날 “한국 정부가 위기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한국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원화 가치 하락을 막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의 '한국 때리기'는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26일자에서 “한국 경제의 위험도가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FT는 “한국의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한국의 외환 상환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10월 6일 FT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금융 위기의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표현했고, 같은 달 9월 WSJ은 "한국은 아시아의 아이슬란드인가"라고 보도했다.
정부 대응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기사가 나오면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게 전부다. 자꾸만 비판이 쏟아 지다 보니 재정부에서는 “일일이 코멘트하고 대응하는 것도 지쳤다”는 반응도 나왔다.
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외채통계의 경우 한국 같이 주기적으로 자세하게 공개하는 나라가 없다"며 "시장의 기대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먹혀 들지가 않으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 안팎에서 “외신의 생리를 너무 모른다”는 것에 대한 자성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것 이상으로 외신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하는데 외신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다는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4일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석이었던 외신담당 대변인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외신의 한국 때리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음을 감안하면 한참 늑장대응을 한 셈이다.
재정부는 '외신 코스트'가 커져가자 허경욱 제1차관이 지난 3일 이코노미스트, FT 등 주요 외신 매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직접 외신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럼에도 외신 기자들은 이날 윤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한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건전성 비율 33%’와 같은 지표에 대해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이 같은 외신들의 '과도한 불신'의 원인으로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한국의 경제구조와 외환위기 때의 '원죄'가 거론된다.
수출의존도가 다른 신흥국과 비교할때 월등히 높고, 자금시장 개방폭도 넓어 지금같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불안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지난 97년 외환위기가 불거지기에 앞서 외환보유액을 거짓으로 공표했던 ‘양치기 소년’ 이미지도 아직까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 대기업 외신 담당 홍보맨은 “외신들이 어떤 기사를 쓸 때는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갖고 쓴다”며 “오보를 했다고 하면서 일회성의 해명을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명확한 논리를 갖고 설득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