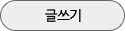1. 정도전의 신권정치
대하드라마 ‘정도전’이 지난 3일 제41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숭늉처럼 달콤하게 들렸다. 지난 5월 나주시 다시면 ‘백동마을’에 있는 삼봉 정도전의 유배지 여정이 떠올랐다. 조선을 설계했던 어른과의 만남에서 ‘개혁과 역사의 도돌이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전은 신권정치가 성리학 이념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통치 질서라고 믿었다. 그가 신권정치는 재상제도에서 출발한다. 국정운영 곧 국가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재상이 권한을 갖는 제도이다. 국왕의 국정수행은 재상의 도움과 견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늘의 의원내각제와 비슷하다.
조선개국은 정도전과 이방원의 합작품이지만 통치제도를 두고 정도전의 신권개혁과 이방원의 왕권보수가 대립한다. 결국 보수의 칼날이 개혁의 심장부를 겨냥하면서 조선 최초의 개혁은 실패하고 말지만 그의 개혁 정신은 6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은 주지할 만하다.
2. 조광조의 도학정치
1백여 년이 지난 1506년,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권좌에 오른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은 중종이라는 허수아비를 내세워 그들의 기득권을 챙겼다. 이른 바 신권을 빙자한 훈구가 왕권을 농락한 훈신정치였다. 중종은 사림의 거장 조광조를 중용하여 훈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조광조는 도학정치로 이상사회 조선을 꿈꾸었던 개혁주의자였다. 도학이란 명분과 의리를 실천하며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정치이념이다. 그의 개혁은 연산군이 파괴했던 성리학적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명분과 의리로 무장하고 있었다. 깨어있는 지식인의 모습이었다.
훈구의 부패 척결, 유교도덕을 지방에 보급시키기 위한 향악 실시, 미신 타파를 위한 도교 제사 소격소 철폐 등 개혁정치를 펼친다. 그러나 중종이 훈구보수에 밀려 명분보다 실리를 택하면서 조광조의 개혁은 좌절되고 만다. 역사는 과거의 일이지만 개혁이 필요한 현실에 투영되기도 한다.
3. 개혁은 친일청산에서 출발한다.
E.H.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통해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바라볼 때 과거는 현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정도전의 신권정치와 조광조의 도학정치는 수백 년 전의 실패한 개혁이지만 이 시대 개혁의 방향타로 이어지고 있다.
개혁이란 권력이 기득권 탐욕을 향할 때 이를 바꾸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오늘의 보수는 친일 반민족 후손들에 장악됐다. 독립군을 토벌한 일본군 장교 출신이 18년이나 통치했고, 그의 장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친일을 혁파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임을 밝힌다.
친일 후손들의 권력욕은 정말 대단하다. 그들에게 권력은 생존이다. 삐뚤어진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면 그들이 이 땅에 존립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개혁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역사와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개혁이고, 새 정치라는 명분으로 행해져야 한다.
4. 개혁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2년 전부터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 좌와 우가 빚어내는 극한 대립이라는 부정적인 정치행태를 일소하고, 아래로 향하는 새로운 민주질서를 만들고 하는 범국민적 여망이 바로 그것이다. 안타깝게도 그 여망은 민주당과의 합당 이후 486과 친노 강경세력들에 짓밟히고 있다.
썩은 땅에 씨앗을 뿌려봤자 싹이 틀리 없고, 싹도 안 트는데 꽃이야 피울 수 있겠는가? 새정연은 새 정치 씨앗이 뿌려질 자리가 아니다. 새 정치가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 외연을 넓히려 했지만 패착으로 귀결됐다. 새 정치를 위한 개혁은 시도도 못했다. 정도전과 조광조가 쓴웃음을 짓고 있다.
중도는 좌도 우도 아닌 것을 이르는 것만은 아니다. 중도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아래다. 아래는 국민이 있는 곳이다. 난파선에서 국민들에게 새 정치 개혁을 주창할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새 정치 개혁은 민주당이라는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이 뻔하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